- 모세종 자립지원센터내비두 운영위원 칼럼 -
|
[편집자주]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사회·경제적 진출의 기회와 폭이 줄어들었다. 청년은 취약계층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순화시켰다. 이러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며, 청년은 여전히 ‘아프다’. 이에 청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경험적, 심층적으로 통찰해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➀ 청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➁ 청년 자립의 패러다임 전환 ➂ 보건복지부의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의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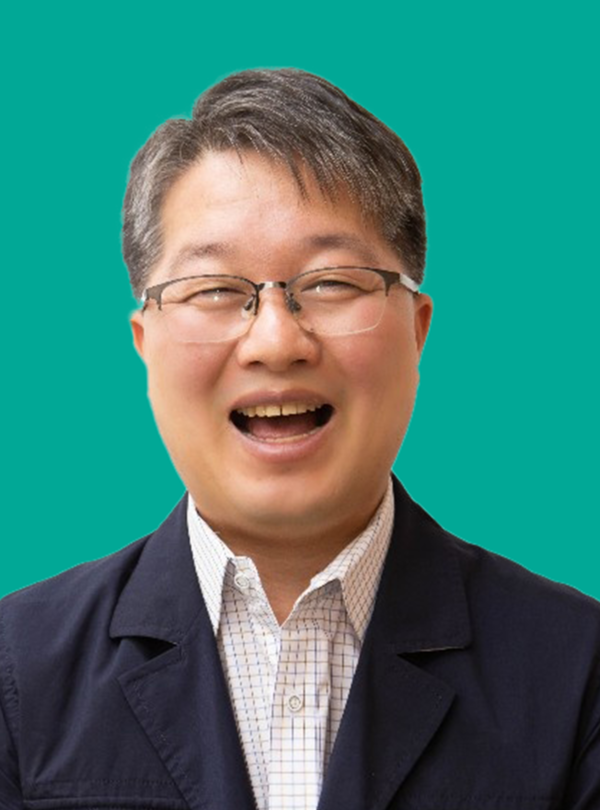
청년, 드디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여기서 ‘청년’은 청년 일반이 아닌 청년 중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이다. 필자는 이러한 ‘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자립 위기’라고 본다.
현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는 청년의 어려움을 대체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한다.
첫째, ‘질풍노도의 시기’의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보는 것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식으로 ‘라떼’를 시전하며 치열했던 ‘낭만’이며 누구나 겪는 잠시의 고통이라는 것이다.
둘째, 청년들의 ‘나약함’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가난의 황무지에서 성공신화를 일군 산업역군이다. 그들은 개인의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죽음 힘을 다했던’ 방식으로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성세대는 자신과 청년의 존재 기반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순화하여 귀결시킨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빈틈이 있지만, 요즘은 구조적으로 사람이 굶어죽는 빈곤한 사회가 아니다.
이 기성세대가 정말 청년을 알고 있는지, 그 고통을 공감하는지 묻고 싶다. 아니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인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청년’의 ‘표’를 의식하게 된 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자조한다.
필자는 20여년 이상 여러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청년들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무기력, 고립감, 집밖 활동 안함. 희망(목표)없음, 니트 상태, 자기/생활관리 안됨, 다른 사람과 관계 무서움, 자기 비하, 결정하지 못함, 일 의미 없거나 무서움, 회사 무서움, 좋아하는 것 없음, 하고자 하는 직업/직무 없음. |
오랫동안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면서 청년의 진짜 위기를 알게 되었다.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개미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위기는 ‘진로, 고립, 은둔’이다. 진로 위기의 원인은 살아오면서 켜켜이 쌓인 ‘경험된 무기력’이다. 고립 위기의 원인은 모든 공동체가 사라진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됐다. 은둔의 위기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발달 과업인 자신을 긍정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자아성’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회성’을 형성하지 못한 정체성의 미형성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청년의 문제를 단순히 '조건'이나 '여건'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 '자신'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때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의 자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다.
